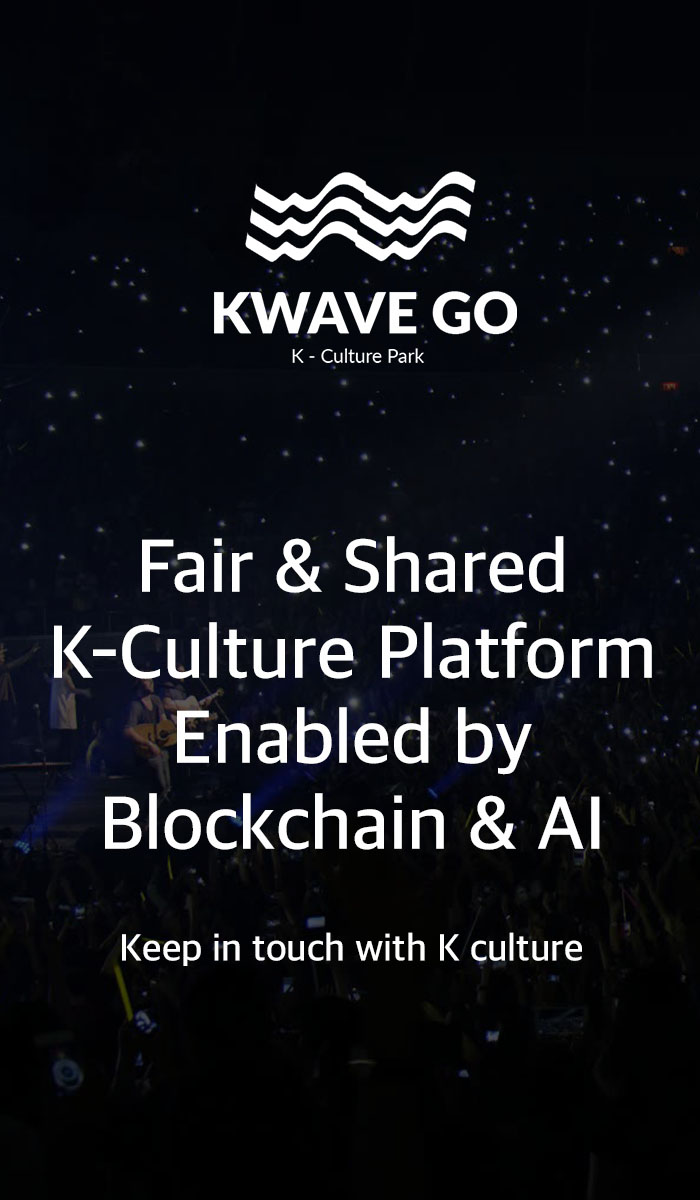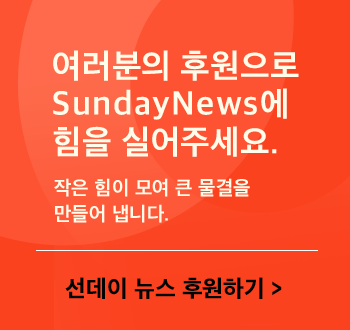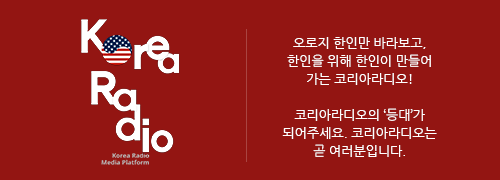고석화 명예이사장- 케빈 김 행장 ‘오너십 경쟁’

유재환 행장 – 마크 이 CCO 동반 사퇴 카드로 합병
고, 대주주 세력 없는 케빈 김 행장 얕봤다가 일격
김의 이사회 장악에 백기 들고 이사장직 사임 ‘굴욕’
아들 피터의 대관식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2016년 7월초, 고석화 윌셔은행 이사장과 케빈 김 BBCN 행장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둘 만의 극비회동이 이루어진 회의실 공간에는 잠깐 적막이 흘렀다.
며칠 뒤 언론에서는 윌셔-BBCN은행 합병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자산규모 123억 달러의 초대형 은행 탄생!
예금고 100억 달러의 통합은행은 커뮤니티 은행 수준이었던 한인은행의 규모를 뛰어넘었다. 합병 방식은 동등합병(merger of equals), 즉100%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두 은행을 통합했다.
합병은행의 행장은 케빈 김 BBCN 행장이 맡았고 이사장은 고석화 윌셔은행 이사장이 맡았다. 또한 합병은행의 지분 소유는BBCN 59%, 윌셔은행 41%로 하며 윌셔은행 주주는 보통주 1주당 0.7034주의 BBCN 주식을 받았다. 이사진의 구성은 BBCN측 9명, 윌셔은행 7명으로 정했다.
합병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석화 이사장은 “오늘은 우리 모두 가슴이 뛰는 날입니다. 지난주 윌셔은행 창립 35주년을 기념했는데 이제 BBCN과 함께 성장과 성취라는 새로운 장을 맞게 됐습니다. 미주 한인과 소수민족들을 위한 최대, 최고의 은행이 되겠습니다”이라며 감격해 했다.
케빈 김 BBCN 행장은 “현 시점에서 윌셔은행과의 합병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말미암는 시너지 효과는 주주들과 고객들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상장사인 두 은행의 시가 총액은 당시 기준 124억달러로 다른 미주 지역 한인은행들의 합계보다 더 큰 규모였다.
이 합병 소식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쪽은 한미은행.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었다. 불과 1~2주전만 해도 BBCN 케빈 행장과 한미은행 이사들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거의 도장 찍을 일만 남았다고 여겼는데 제대로 뒷통수를 맞은 것이었다.
한인은행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빅딜의 판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고석화 이사장과 케빈 김 행장이 나눈 독대에는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
고석화 이사장은 타고난 사업가이자 승부사였다. 전문경영인 은행장들을 조율하며 바닥부터 키워온 윌셔은행이었다. 고 이사장은 아들 피터가 잘 이어받아 더 큰 규모의 전국 은행을 이끄는 행장이 되는 것을 원했다. 또, 인수합병의 키를 쥐고 있던 케빈 김 행장은 통합은행이 탄생할 경우 대주주로부터 확실한 은행장 임기 보장 카드가 필요했다. 한미은행은 노광길 이사장(지금은 은퇴)이 이사회를 이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김 행장을 밀어준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였다.
김 행장은 아들 피터가 고 이사장의 아킬레스 건임을 파악했다. 아이비리그 명문대인 컬럼비아대를 졸업한 모범생이었지만 숫기가 없던 피터는 고 이사장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처럼 보였다. 전쟁터같은 은행 이사회를 피터가 장악해 가려면 강력한 보호막이 필요했다. 당시 김 행장도 마찬가지였다. 직원 한 명 없던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배고픈 시절을 겪어본 그였다. 그에겐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예민한 생존본능이 꿈틀거렸다.
김 행장이 고 이사장과의 극비 회동에서 내놓은 카드는 바로 유재환 행장(당시 윌셔은행장) – 마크 이 CCO(당시 BBCN CCO) 동반 사퇴 카드였다.
“이사장님, 아드님 잘 키우셨습니다. 행장을 맡겨주시면 제가 피터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고 이사장은 흡족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김 행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산규모 123억불 짜리 초대형 은행의 수장이 금융권 경력 10년조차 되는 않는 행장이 맡게 된 것이다.
유재환 윌셔은행 행장에겐 통합은행의 컨설팅 업무를 맡겨 반발을 최소화했지만 마크 이 BBCN 수석 전무는 강하게 반발했다. 마크 이 CCO(Chief Credit Officer)는 1992년부터 은행권에서만 17년간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뱅커. BBCN에서 7년간 있으며 이사들을 관리하던 차기 행장을 노리던 잠룡이었다. 하지만 케빈 김의 야심 앞에서 마크도 꿈쩍할 수 없었다. 결국 마크는 캐세이 뱅크로 자리를 옮긴후 CCO를 맡았다. 마크 수석전무는 뱅크오브호프에서 당한 명예를 되찾기 위해 캐세이 뱅크에서 밤잠을 잊고 매진했다.
그 결과 케세이 뱅크는 아시아계 은행으로는 가장 먼저 자산 규모 200억 달러를 찍었다. 수익율도 뱅크오브호프 보다 높았다. 캐세이뱅크의 총자산순이익율(ROA)는 1.55%로. 뱅크오브호프의 1.23%보다 격차는 32베이시스포인트 높았다. 100달러 운영 수익을 따지면 32센트를 더 벌었다는 얘기다.
능력으로 보면 마크 이가 통합은행의 핵심 간부로로선택받아야 했지만 피터 고의 카드를 택한 것은 김 행장의 전략과 고 이사장의 이해관계가 없었더라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케빈 김 행장은 컽으로는 온화한 척 했지만 비정했다. 상대의 목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몸의 팔 다리 하나 정도는 내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마크조차 내칠 수 있었던 것도 비정할 정도의 냉정함이 몸에 배여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윌셔-BBCN은행의 통합이라는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고-김 두 사람에겐 불꽃이 튀었다.
합병 초기만 해도 고 이사장은 케빈 김 행장의 존재를 과소평가했다. 윌셔은행 창립부터 35년을 이끌어 오면서 산전수전을 경험한 고 이사장은 이사회 평정을 딱 1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고 이사장의 이런 예상은 빗나갔고, 예상치 않는 일격을 맞았다. 케빈 김 행장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이었다. 케빈 행장의 가장 큰 장점은 역설적으로 금융을 모르고, 법은 잘 안다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뱅커 마인드가 아니다 보니,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했다. 꽉 막힌 전형적인 은행가 출신들이라면 전혀 추진하지 못했을 합병을 두 눈 질끈 감고 밀어부칠 수 있었다. 또 변호사로서 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빨리 파악한 터라 은행에선 이사회 정관과 의결사항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김 행장은 이사들을 구워삼기 위한 채찍과 당근을 준비했다. 이사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사에게는 미국 주류은행의 기준에 맞는 전문성과 영어 소통을 강조했다. 마치 영어를 잘 못하는 1세 한인들이 한인 업주들에게는 잔소리와 불만을 소리있는 대로 지르다가도, 미국 스토어에 가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식이었다. 영어로 진행되는 은행 이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명분도 좋았다. ‘우리는 더이상 커뮤니티 은행이 아니라 100억불대가 넘는 리저널 은행’이라며 은행 이사의 선임 기준을 강화했고, 새로 영입하는 미국인 이사는 철저하게 본인이 인터뷰까지 챙기면서 성향을 파악했다. 미국인 이사들은 나스닥 상장 은행이 주는 베네핏을 즐겼고, 이사 역할에 따라 받는 컴펜세이션이 15~20만불 가까이 되다 보니 김 행장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충실한 거수기 역할을 자처했다.
김 행장의 이사들 줄세우기는 가속화 되었는데, 김 행장이 BBCN에서 한인은행으론 유일하게 행장과 이사장을 겸임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중앙은행 때부터 친했던 이사들도 뜻이 맞지 않으면 내보낸 김 행장의 카리스마에 눌린 이사들은 향후 대세를 케빈 김 행장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시작했다.
고 이사장은 윌셔은행 출신 이사들마저 계속 한발씩 케빈 행장 쪽으로 움직이고 눈치를 보자 마음이 불안해졌다. 이사회에선 웃고 정담을 나눴지만 돌아서면 서로 복잡한 셈법이 생겨났다.
출범 1년만인 2017년, 케빈 김 행장이 먼저 칼을 빼들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사장 교체를 단행한 것이다. 외부로는 고령의 고 이사장 사임하고 후임 이사에게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명분을 가졌지만 내부적으로는 고 이사장 시대의 종말을 고한 것이다. 400만주를 들고 있던 대주주로선 초라한 퇴로였다. 게다가 신임 이사장에 오른 스캇 황(한국명 윤석황)은 케빈 김 행장과 BBCN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었다.

김 행장은 은행 간부들의 혼선을 막기위한 사전 작업도 충실히 진행했다. 처음으로 간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장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이다. 수석전무(SEVP), 전무(EVP), 일부 부행장(SVP), 부장(FVP)을 대상으로 근무기간과 성과 성취정도에 따라서 양도제한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RSUs)을 풀기로 한 것. 물론 자신을 포함한 최고경영자(CEO)도 당연히 포함시켰다. 근속(time-vesting) 3년을 1주기로 양도제한부주식수령권(performance based RSUs)을 받을 자격을 부여했다. 목표 성취도에 따라 최대150%의 성과 기준으로 주식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해 김 행장은 근속과 성과 명목으로 5만7312주의 주식(RSUs)을 챙겼다.
2년이 지나자, 케빈 김 행장은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통합 은행으로서 미 전국으로 외연을 키우려면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이사장 겸임을 요청했다.
영업 강화, 수익 다변화를 위해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논지의 김 행장의 말이 나오자마자 이사회는 술렁거렸으나 금방 차분해졌다. 물론 김 행장은 이사회에 당근책을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사 14명 전원을 재선임한 것이다. 이 때가 2019년이었다.
고 명예 이사장에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기였다. 그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이런 수모도 아들 피터 고의 대관식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참을 수 있다. 김 행장 실력은 금방 들어나고야 말거야’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대운은 김 행장 편이었다. 전세계 덮친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되려 김 행장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행장의 실력이나 은행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연방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이 은행을 통해 뿌려졌다. 한인은행 전체가 외형적인 매출과 순익이 급성장했다.
코로나 종식이 논의될 2022년 중반 이후 은행 위기를 강조하는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금융권에도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혼돈의 빅뱅이 올텐데 김 행장의 머릿 속은 복잡해졌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2021년 12월, 그는 피터 노의 최고운영자(CCO) 승진을 구상해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고 명예 이사장은 반색했다. 얼음장 같았던 이사회 회의에서 오랜만에 웃음꽃이 터져 나왔다. 수족 같은 대니얼 김 최고전략(CSO)에게 전략을 빼서 피터 고에게 넘기고 데이빗 멀론을 은퇴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음에 계속)
이준 기자
서울대/UCLA MBA
전 비즈위클리 기자